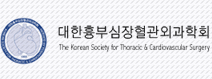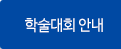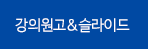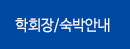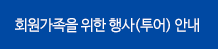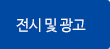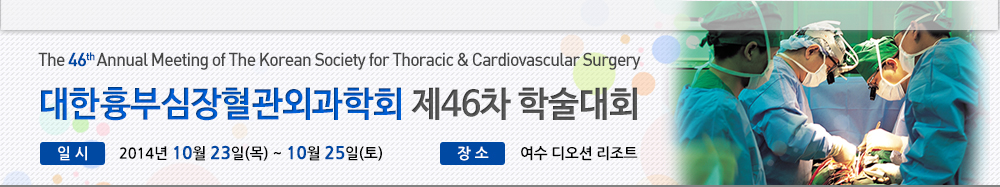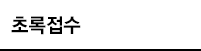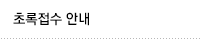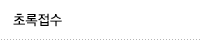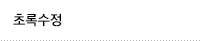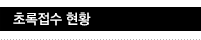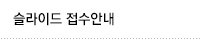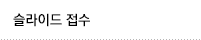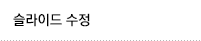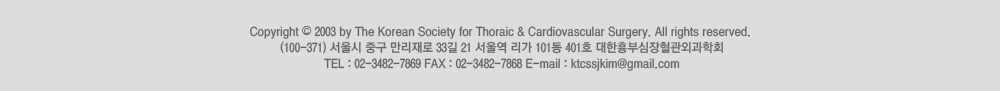초록접수 현황
| 14F-066 | 구연 발표 |
복부 대동맥류 치료의 중장기 성적
오홍철, 김용한, 김경환, 김기봉, 안혁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서울대학교병원 흉부외과학교실
목적 : 저자들은 지난 10년간의 복부대동맥류 치료의 임상 성적을 후향적으로 고찰하였다.
방법 : 2004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복부대동맥류로 개복술 또는 스텐트 그라프트 시술을 시행 받은 137명(개복술 128명, 스텐트 그라프트 삽입술 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평균 나이는 68.4±9.3(스텐트 그라프트군 : 76.7±5.7)세 였으며, 남자가 88.3%(121/137)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대동맥류의 위치를 세분류해보면 supra/juxtarenal 7.3%(10/137), infrarenal 92.7%(127/137)로 대부분 신동맥 하부에 위치하였다. 복부 대동맥류의 평균 크기는 6.0 ± 1.5cm(스텐트 그라프트군 : 6.0 ± 1.9cm)이었고 62.0%(85/137)의 환자가 고혈압의 과거력이 있었으며, 관상동맥 우회술을 시행 받은 경우도 14.6%(20/137)있었다. 복부 대동맥류 파열 및 파열이 임박한 경우(impending rupture), 참을 수 없는 복통(intractable pain)을 호소했던 9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정규로 수술을 시행하였다. 장골동맥류가 78.8%(108/137)에서 동반되었다.
결과 : 수술 사망률은 2.9%(4/137)이고, 파열된 대동맥류의 경우, 사망률은 40%(2/5)였다. 평균 추적 관찰 기간은 41.1개월(1개월~123개월)이고, 추적관찰 중 5명의 사망례가 있었다(급성심근경색 1례, 췌장암 1례, 급성 호흡곤란증후군 1례, 장파열 1례, 고칼륨혈증 1례). 내장골동맥은 48례에서 일측을 결찰하였고(우내장골동맥 결찰 17.5%(24/137), 좌내장골동맥 결찰 17.5%(24/137)), 9례에서 양측을 결찰하였다. 양측내장골동맥 결찰 후 조기 합병증은 없었다. Juxta or suprarenal AAA중 4례에서 thoracoabdominal approach로 수술 시행 하였으며, 이중 2례에서 cold Hartman solution을 이용한 renal protection을 시행 하였다. 1례에서 술 후 5일에 시행한 전산화 혈관조영술에서 좌외장골 동맥의 폐쇄소견 보여 원위부 문합을 대퇴동맥에 재시행하였다. 또 내장골동맥 결찰 후 45개월째에 내장골동맥류의 확장으로 재수술을 시행한 경우가 1례 있었다. 조기 합병증은 급성 신부전 4.4%(6/137), 재개복이 필요한 출혈 3.6%(5/137), 상처 감염 6.6%(9/137)가 있었다. 기타 유미복막(chyloperitoneum) 5례, 간농양이 1례 있었다. 스텐트 그라프트를 시행한 9례 중 사망 환자는 없었으나 시술 직후 혈관내누출(endoleak) 4례(1형 1례, 2형 3례)가 발생하였다. 이중 1례에서 f/U 54개월째 graft Lt. limb의 dislocation 생겼다.
결론 : 복부 대동맥류의 외과적 치료 성적 및 중장기 추적 결과는 비교적 만족할 만 하였다. 양측 내장골 동맥에 병변이 있는 경우 동맥류재발에 대하여 관찰을 요한다. 스텐트 그라프트 시술은 수술합병증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권장할 수 있으나, 시술 후 합병증에 대한 장기적인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방법 : 2004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복부대동맥류로 개복술 또는 스텐트 그라프트 시술을 시행 받은 137명(개복술 128명, 스텐트 그라프트 삽입술 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평균 나이는 68.4±9.3(스텐트 그라프트군 : 76.7±5.7)세 였으며, 남자가 88.3%(121/137)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대동맥류의 위치를 세분류해보면 supra/juxtarenal 7.3%(10/137), infrarenal 92.7%(127/137)로 대부분 신동맥 하부에 위치하였다. 복부 대동맥류의 평균 크기는 6.0 ± 1.5cm(스텐트 그라프트군 : 6.0 ± 1.9cm)이었고 62.0%(85/137)의 환자가 고혈압의 과거력이 있었으며, 관상동맥 우회술을 시행 받은 경우도 14.6%(20/137)있었다. 복부 대동맥류 파열 및 파열이 임박한 경우(impending rupture), 참을 수 없는 복통(intractable pain)을 호소했던 9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정규로 수술을 시행하였다. 장골동맥류가 78.8%(108/137)에서 동반되었다.
결과 : 수술 사망률은 2.9%(4/137)이고, 파열된 대동맥류의 경우, 사망률은 40%(2/5)였다. 평균 추적 관찰 기간은 41.1개월(1개월~123개월)이고, 추적관찰 중 5명의 사망례가 있었다(급성심근경색 1례, 췌장암 1례, 급성 호흡곤란증후군 1례, 장파열 1례, 고칼륨혈증 1례). 내장골동맥은 48례에서 일측을 결찰하였고(우내장골동맥 결찰 17.5%(24/137), 좌내장골동맥 결찰 17.5%(24/137)), 9례에서 양측을 결찰하였다. 양측내장골동맥 결찰 후 조기 합병증은 없었다. Juxta or suprarenal AAA중 4례에서 thoracoabdominal approach로 수술 시행 하였으며, 이중 2례에서 cold Hartman solution을 이용한 renal protection을 시행 하였다. 1례에서 술 후 5일에 시행한 전산화 혈관조영술에서 좌외장골 동맥의 폐쇄소견 보여 원위부 문합을 대퇴동맥에 재시행하였다. 또 내장골동맥 결찰 후 45개월째에 내장골동맥류의 확장으로 재수술을 시행한 경우가 1례 있었다. 조기 합병증은 급성 신부전 4.4%(6/137), 재개복이 필요한 출혈 3.6%(5/137), 상처 감염 6.6%(9/137)가 있었다. 기타 유미복막(chyloperitoneum) 5례, 간농양이 1례 있었다. 스텐트 그라프트를 시행한 9례 중 사망 환자는 없었으나 시술 직후 혈관내누출(endoleak) 4례(1형 1례, 2형 3례)가 발생하였다. 이중 1례에서 f/U 54개월째 graft Lt. limb의 dislocation 생겼다.
결론 : 복부 대동맥류의 외과적 치료 성적 및 중장기 추적 결과는 비교적 만족할 만 하였다. 양측 내장골 동맥에 병변이 있는 경우 동맥류재발에 대하여 관찰을 요한다. 스텐트 그라프트 시술은 수술합병증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권장할 수 있으나, 시술 후 합병증에 대한 장기적인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책임저자: 김경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서울대학교병원 흉부외과학교실
연락처 : 오홍철, Tel: 02-2072-2347 , E-mail : elmio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