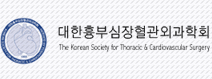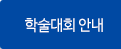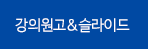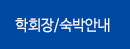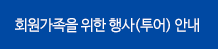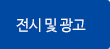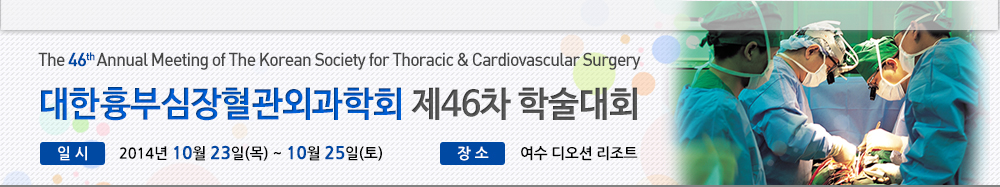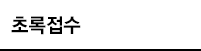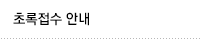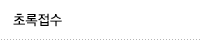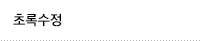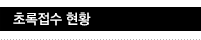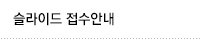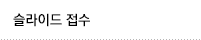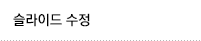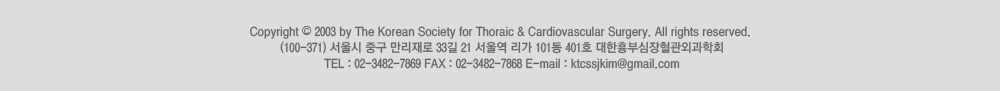초록접수 현황
| 14F-167 | 구연 발표 |
대장암으로부터 전이된 다발성 폐전이 환자의 폐절제술 후 생존 및 예후인자 분석
조종호¹, 김홍관¹, 최용수¹, 김관민², 조재일¹, 심영목¹, 김진국¹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 흉부외과학교실¹,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흉부외과학교실²
목적 : 대장암의 폐전이로 폐절제술을 고려할 경우, 다발성 폐전이는 단일 폐전이에 비해 장기 생존에 있어 불량한 예후인자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다발성 폐전이 환자 중 폐전이 개수에 따라 폐전이 수술 후 예후에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과연 얼마나 많은 개수의 폐전이가 동반된 경우 수술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이에 대장암의 다발성 폐전이에 대한 폐절제술 후 장기 성적 및 예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방법 : 1997년부터 2012년까지 삼성서울병원에서 대장암에 의한 폐전이로 폐절제술을 시행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절제된 폐전이의 개수에 따라 세 군으로 구분하였다 (Group I: 단일 폐전이, Group II: 폐전이 개수가 2개 또는 3개, Group III: 폐전이 개수가 4개 이상). 이들의 수술전 임상양상 및 병리학적 특징, 수술후 재발 및 생존에 관한 장기 성적 그리고 예후인자를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결과 : 대상환자는 총 532명이었고 평균 연령은 59세(62 – 82세) 였으며, 이중 남자가 318명(60%)이었다. 추적관찰기간의 중앙값은 36개월(0 - 211개월)이었다. 원발암 수술 후 폐절제술까지의 평균 기간은 20개월(0 – 209개월)이었다. 절제된 폐전이의 개수는 1개, 2개, 3개, 그리고 4개 이상이 각각 354명(67%), 97명(18%), 42명(7.8%), 39명(7.3%)이었다. 폐절제술 후 보조적 항암화학요법은 384명(72%)에서 시행되었다. Group I, Group II, Group III의 5년 생존율은 각각 65%, 57%, 41%였으며 (Group I vs II, p=0.302; Group II vs III, p=0.006), 5년 무병생존율은 각각 43%, 18%, 0%였다 (Group I vs II, p=0.302; Group II vs III, p=0.006). 생존에 따른 예후인자의 다변량 분석에서 다발성 폐전이는 독립적으로 유의한 예후 인자였다 (Group I vs Group II, HR 1.35, 95% CI 0.87~2.05, p=0.177; Group II vs Group III, HR 2.38, 95% CI 1.09~4.9, p=0.033; Group I vs Group III, HR 3.22, 95% CI 1.47~6.45, p=0.004). 무병 생존에 따른 예후인자의 다변량 분석에서도 다발성 폐전이는 독립적으로 유의한 예후 인자였다(Group I vs Group II, HR 1.62, 95% CI 1.23~2.13, p<0.001; Group II vs Group III, HR 1.37, 95% CI 0.86~2.09, p=0.177; Group I vs Group III, HR 2.22, 95% CI 1.43~3.31, p<0.001).
결론 : 대장암의 폐전이에 대한 수술시 폐전이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예후가 불량하였다. 다발성 폐전이라 하더라도 전이 개수가 3개 이하인 경우 단일 폐전이와 비교하여 대등한 예후를 보였다. 다발성 폐전이, 특히 4개 이상의 폐전이가 동반된 경우 폐절제술을 신중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방법 : 1997년부터 2012년까지 삼성서울병원에서 대장암에 의한 폐전이로 폐절제술을 시행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절제된 폐전이의 개수에 따라 세 군으로 구분하였다 (Group I: 단일 폐전이, Group II: 폐전이 개수가 2개 또는 3개, Group III: 폐전이 개수가 4개 이상). 이들의 수술전 임상양상 및 병리학적 특징, 수술후 재발 및 생존에 관한 장기 성적 그리고 예후인자를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결과 : 대상환자는 총 532명이었고 평균 연령은 59세(62 – 82세) 였으며, 이중 남자가 318명(60%)이었다. 추적관찰기간의 중앙값은 36개월(0 - 211개월)이었다. 원발암 수술 후 폐절제술까지의 평균 기간은 20개월(0 – 209개월)이었다. 절제된 폐전이의 개수는 1개, 2개, 3개, 그리고 4개 이상이 각각 354명(67%), 97명(18%), 42명(7.8%), 39명(7.3%)이었다. 폐절제술 후 보조적 항암화학요법은 384명(72%)에서 시행되었다. Group I, Group II, Group III의 5년 생존율은 각각 65%, 57%, 41%였으며 (Group I vs II, p=0.302; Group II vs III, p=0.006), 5년 무병생존율은 각각 43%, 18%, 0%였다 (Group I vs II, p=0.302; Group II vs III, p=0.006). 생존에 따른 예후인자의 다변량 분석에서 다발성 폐전이는 독립적으로 유의한 예후 인자였다 (Group I vs Group II, HR 1.35, 95% CI 0.87~2.05, p=0.177; Group II vs Group III, HR 2.38, 95% CI 1.09~4.9, p=0.033; Group I vs Group III, HR 3.22, 95% CI 1.47~6.45, p=0.004). 무병 생존에 따른 예후인자의 다변량 분석에서도 다발성 폐전이는 독립적으로 유의한 예후 인자였다(Group I vs Group II, HR 1.62, 95% CI 1.23~2.13, p<0.001; Group II vs Group III, HR 1.37, 95% CI 0.86~2.09, p=0.177; Group I vs Group III, HR 2.22, 95% CI 1.43~3.31, p<0.001).
결론 : 대장암의 폐전이에 대한 수술시 폐전이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예후가 불량하였다. 다발성 폐전이라 하더라도 전이 개수가 3개 이하인 경우 단일 폐전이와 비교하여 대등한 예후를 보였다. 다발성 폐전이, 특히 4개 이상의 폐전이가 동반된 경우 폐절제술을 신중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책임저자: 김진국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 흉부외과학교실
연락처 : 조종호, Tel: 02-3410-1696 , E-mail : jongho.cho@gmail.com